[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e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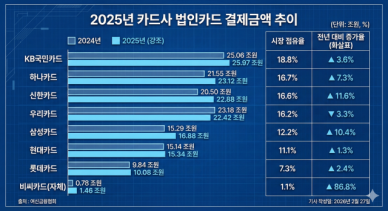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233105234_388_13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