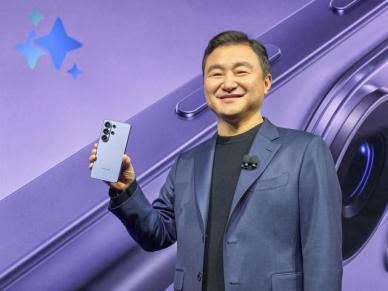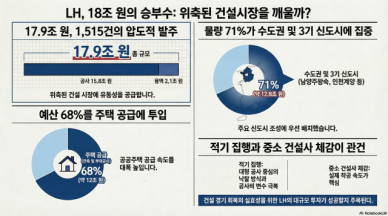다만 단기 상품 위주로 운용해 온 증권사들이 장기 상품으로 발을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 현재 금융당국에 IMA 사업 인가를 신청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원금이 전액 보장되며 연 4~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기존 발행어음이 1년 이하 단기상품에 한정됐던 반면 IMA는 1년 이상 장기 상품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중단 상태에 머물러 왔다. 그러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도권으로 다시 편입됐다.
IMA 인가가 확정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보다 간편하고 예금보다 유연하게 장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단기자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자금을 직접 조달·운용할 수 있어 자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순 중개나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운용형'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들이 IMA 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 능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어음 레버리지가 자기자본의 200%였다면 IMA는 300%까지 가능하다.
IMA 사업 인가 신청 조건인 자기자본 8조원의 대형증권사들은 이를 통해 최대 24조원의 추가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본 기반 확대는 곧 운용력 강화로 이어지는 만큼 각 사가 인가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사는 연내 예정된 인가 심사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신청사 최초로 IMA 전담 부서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IMA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NH투자증권 또한 지난 8월 TF를 꾸리는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단기 상품에 익숙했던 증권사들이 중장기 운용에 나설 경우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발행어음 사업 역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IMA 사업 초기에는 공격적인 전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자금 운용 전략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이나 IMA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 인식된다"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보다 투자에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 예금이 증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은 1년 만기 상품이지만 IMA는 7~8년 만기의 중장기적 상품으로 증권사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연구원은 금융당국과 증권사가 추정하는 4~8% 수익률에 대해서는 "발행어음 마진이 2%라면 IMA 마진은 1%대로 가정한다"며 "목표 수익률이 있어도 결국 수익은 성과보수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익은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