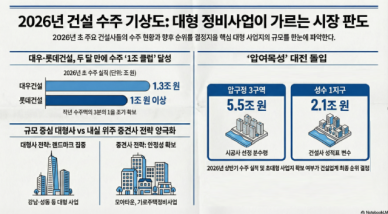[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은행(IB)을 거치지 않는 기업공개(IPO) 방식인 직상장을 허용하자, 국내에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경로가 추가되는 장점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IPO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잇다.
◇상장 시 주간사 없이 ‘경매 방식’으로 가격 결정
24일 금융투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SE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기업 직상장(direct list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SEC가 허용한 직상장은 IB 등이 인수자로 나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IPO와 달리 기업이 직접 주식을 증시에 제공한다.
세부적인 직상장 과정을 살펴보면, 상장주식에 대해 NYSE와 투자은행(자문인) 간의 협의를 거쳐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을 먼저 결정한다. 상장 첫날 NYSE의 지정시장조성자(designated market maker)는 이 준거가격을 기준으로, 매수‧매도 주문에 근거한 개시경매를 진행하고, 여기서 ‘개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직상장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경우, 기존 IPO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IB에게 지불하는 인수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 후 주식매도금지기간(lockup period) 없이 기존 주주들은 곧바로 자신의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IB의 기업가치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주가가 사실상 경매 방식으로 진행돼 IB가 공모가격을 너무 낮거나 높게 책정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견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IPO는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고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도하면서 사실상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기존 IPO에서 투자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단계에서 공모가격을 결정할 때 불투명한 절차를 거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상장하게 되면 상장 전 주간사의 신주 인수와 기관투자자 배정이 생략되면서 좀 더 정확한 기업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기에 보다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직상장, 해외 사례서 개선책 모색해야”
국내에서는 장외시장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총 주식 수의 30%이상을 소액주주(주식평가액 1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미만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상장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원칙적으로는 직상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상장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특이사례다보니 국내에서는 직상장 사례는 단 세 건이 전부다. 1991년 2월 케니상사, 1994년 4월 외환은행, 1998년 12월 한국통신이 직상장으로 상장했다. 다만, 케니상사는 상장 6개월 만에 부도나면서 상장폐지 됐고,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면서 2013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다만, 케니상사를 제외하면,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부보유 주식 매각 등 정책적 고려에 따른 예외적인 결정으로, 당장 직상장 제도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직상장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차후 관련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상장은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고, 신주발행 직상장은 해외에서도 이제 제도가 마련돼 향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되도록 끊임없이 개선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