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손해 배상율이 결정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키코 상품 판매 은행 6곳은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이며, 배상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다.
분조위는 먼저 판매 은행들이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근거다.
은행측의 명확한 설명이 부재했다는 점도 지목됐다. '설명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4개 기업의 경우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는데 업체들의 피해액은 총 1500억원 가량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으로 모두 255억원 규모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기업-은행 간 수용의사가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또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이번 건과 관련해 은행이 배상에 나서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발생하므로 은행들은 배상에 소극적일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서 미흡했다"며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4개 기업 외 150개에 달하는 나머지 기업들도 이번 분조위 결정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키코 사태 발생 11년만에, 또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과 동시에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도출됐다.
키코공대위는 "11년을 기다린 결과는 좀 아쉽지만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피해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물꼬가 드디어 터졌다. 은행들의 성의 있는 조치와 추가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한 바 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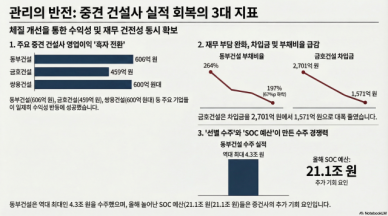




![[세미콘코리아2026] 반도체 경쟁 축, 장비에서 공정 내부 물류로…세미콘서 확인된 자율주행 로봇 전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62028118949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