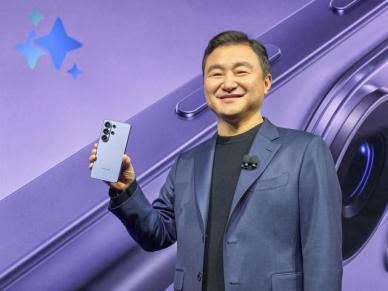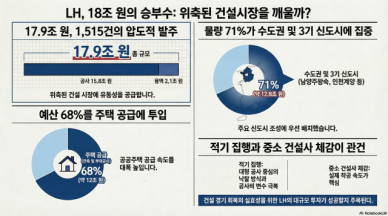[사진=쿠팡 홈페이지]
쿠팡에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혁신’. 그러나 쿠팡은 롤모델이 아마존이라는 점에서 ‘퍼스트무버’가 아닌 ‘패스트팔로워’라 할 수 있다. 여타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해자’ 입장은 아니다. 향후 생존을 위한 뚜렷한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쿠팡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는 올해 상반기 155억엔(한화 약 165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4년 만에 첫 적자다. 이 소식은 시장의 시선을 쿠팡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받은 탓이다. 2015년 6월 10억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도 20억달러가 투입됐다.
쿠팡 매출액은 2015년 1조1338억원에서 지난해 4조4228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5470억원에서 1조970억원으로 확대됐다. 통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변동비보다는 고정비 비중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판관비 항목 중에서도 인건비 등 변동비 비중이 높다. 외형이 성장해도 수익성 제고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쿠팡의 가용자금은 1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쿠팡의 현재 손실 추이 등을 감안하면 향후 1~2년 내 전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의 유동부채는 1조4691억원으로 비유동부채(3655억원)의 4배 수준이다. 단기채무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유동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은 각각 6442억원, 679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금성자산(단기금융자산 포함 8000억원)도 상회하는 규모다.
소프트뱅크 영업손실은 물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우버, 위워크 등의 기업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쿠팡도 추가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나스닥 기업공개(IPO)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타 이커머스 경쟁사 대비 자금조달 창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쿠팡 ‘혁신’은 어디에
쿠팡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당일 배송’을 내세운 로켓배송을 시작한 후 이커머스업계는 물류전쟁에 빠졌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쿠팡의 롤모델은 아마존이다.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을 중시하며 공격적 경영을 펼쳤지만 ‘퍼스트 무버’가 아닌 ‘패스트 팔로워’다. 쿠팡이츠도 사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아마존이 현재 쿠팡과 같은 전략을 펼쳤던 시기(1990년 후반~2000년 초반)는 인터넷 쇼핑 등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를 간파하고 해당 시장을 연 아마존은 설립 8년 만에 흑자전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현재는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사진=쿠팡 제공]
쿠팡의 현재 시장점유율은 7% 수준이다. 그간 고성장을 이뤘지만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시장점유율을 대폭 늘려도 판가인상 등 전략 수정은 독이 될 수 있다. 고객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풀필먼트다. 경쟁업체와 달리 사업 초기부터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유통과 함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통상 유통업에서 물류는 비용이지만 쿠팡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택배단가가 오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즉 쿠팡은 이커머스 자체 성장보다 여타 연계 사업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야 함을 뜻한다.
신평사 관계자는 “고객이 많을수록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며 “쿠팡은 이커머스를 유저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타 사업으로 연계해 영역을 넓혀야 하지만 시장 경쟁 강도 등이 높아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쿠팡이 현재 보유한 자금이 소진되고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면 피인수합병(M&A)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IPO는 물론 M&A에서도 쿠팡은 향후 수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부문은 물류”라며 “여타 온라인 경쟁업체들은 직매입으로 수익구조가 나빠졌지만 쿠팡은 물류투자로 직매입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 위워크와 다르게 쿠팡은 ‘혁신’보다 ‘진화’에 가깝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