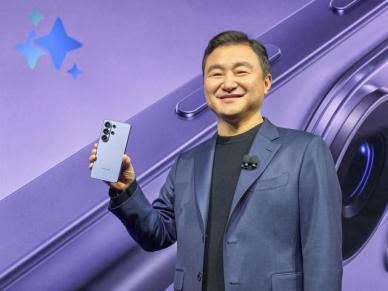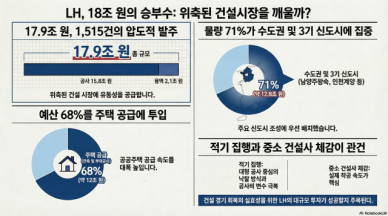무엇보다 중처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핵심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명화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수사 및 사법 기관은 일관된 잣대로 법을 적용해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지도 감독을 우선시하고,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도 절실하다. 중처법 적용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안전 관리 역량이나 재정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 이들에게 단순히 법적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산재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정 및 기술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컨설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다. 복잡한 법적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처법의 핵심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고의 사전 예방에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제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경영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작업 현장의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위험 요인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기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처법의 안착은 법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큼이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중처법이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전 혁신의 지렛대가 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의식 고취가 이뤄져야 중대재해 없는 사회가 찾아 올 것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