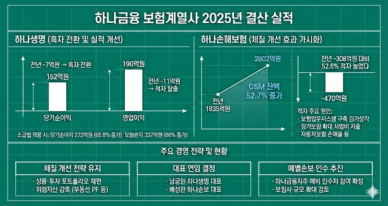[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