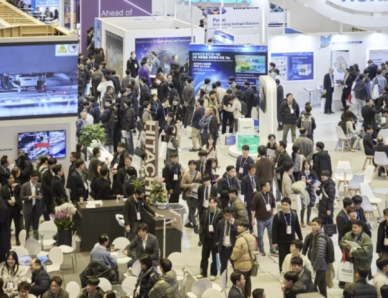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