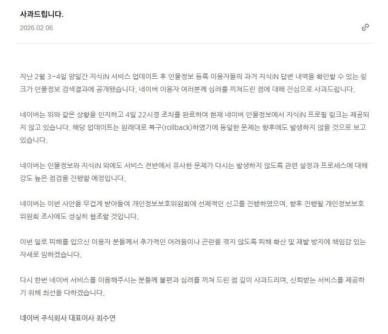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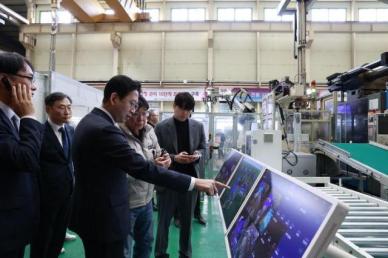
![[정보운의 강철부대] 해저케이블 경쟁의 진짜 진입장벽…기술 아닌 선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60122963538_388_136.jpg)
![[방예준의 캐치 보카]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으로 확대...카드 혜택·보험 상품도 운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0336471222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조용히 커지는 간암 위험…비만·지방간이 새 주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093901364960_388_136.jpg)
![[김아령의 오토세이프] BMW 전동화·제어장치 리콜…기아·포르쉐 무상수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084738970490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