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의 고전력·고대역폭 환경에 맞춰 메모리 기술이 구조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3D D램에 집중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은 장기적 의미가 크다”며 “결국에는 HBM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이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삼성전자의 시도가 기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3D D램은 기존 D램의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3D D램은 기존 D램이 셀을 수평으로 배열하던 방식과 달리 셀과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다. 이 같은 수직 적층 구조를 활용하면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셀을 배치할 수 있어 집적도가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 또 셀 간 간섭과 발열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반도체 전문 학회인 ‘멤콘 2024’에서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V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3D D램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중에 초기형 3D D램을 공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완성형 3D D램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로드맵에 소개된 VCT 기술은 전자의 흐름을 수직으로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낸드플래시에서 수직 구조 전환을 선도한 삼성전자의 공정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시장이 3D D램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성능 GPU와 AI 연산을 위한 서버 메모리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주력 메모리는 고대역폭메모리(HBM)지만 HBM은 칩을 높이 쌓을수록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가 심화되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HBM 이후 세대의 메모리 구조가 3D D램을 기반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3D D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VLSI 2024’ 학회에서 5단 적층 3D D램 시제품을 공개하며 56.1%의 수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크론은 공식적으로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3D D램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D D램이 HBM의 상업성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는 3D D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제시한 3D D램 로드맵은 기존 기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단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아직 2024년 사업보고서에도 관련 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면 상용화 가능성은 일정 수준의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꽤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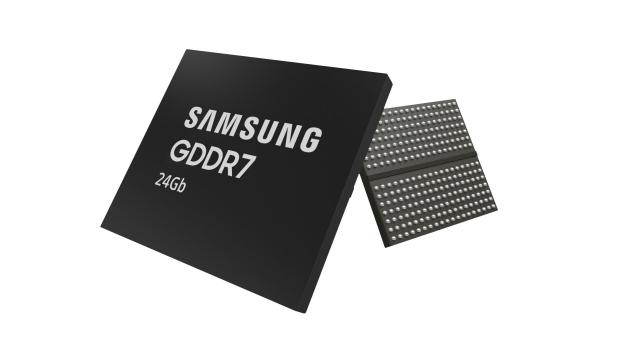








![[정보운의 강철부대] 인도 조선 자립의 현실적 파트너, 왜 한국일 수밖에 없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50107755669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당뇨병, 중장년층 질환 인식 깨졌다…젊은 환자·성인 1형 증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92920946710_388_136.jpg)
![에너지가 넥스트 코어... 철강과 가스, 수소의 트리플 크라운 [포스코의 대전환 철(鐵)에서 미래(Future)로 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1/20260131121832120370_388_136.png)